자연과 이성의 절대적 믿음이 깨져버린 산업화 사회에서, 혹은 더 이상 완전한 치유가 불가능한 현대인의 의식 속에서, 자연 풍경을 새로운 어법과 정서로 가져오는 것은 시인을 구조자적 탐구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움과 회환, 고독과 쓸쓸함 등 인간적 번뇌를 떨쳐 버리지 못하고 삶의 진실에 천착하는 시인의 내면을 풍경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은 오롯이 시인만의 몫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력은 누군가에게 일말의 공감과 위안을 느끼게 한다. 시인이 자연 풍경을 단순히 수사적 기교로 위장하며 시적 진실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표정과 뉘앙스를 읽어내고, 그것들을 존재의 내면으로 치열하게 펼쳐낼 때 서정적 울림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독자들 역시 잘 알고 있다.
가뭄 끝에 소낙비가 후려치니
열두 폭
아니 스무 폭
찢어진 서른 폭쯤으로
자드락비 병풍이 펼쳐지네
모이는 손톱 발톱이
마음이 잘 맞는 계? 모임 같네
책장에서 내려와 뒹구는 머리통 굵은 책들
적막이 딛는 댓돌처럼 바라보네
시내를 갈지자로 걷는 징검돌처럼 바라보네
맨발로 디뎌볼까
소낙비 돌아가고 나면
졸음이 무거워진 머리에 목침인양 괴어볼까
쓸쓸함도 한 물건 같네
두 폭 머리병풍처럼 졸아들고
그마저도 접혀 사라질까
빗소리 시원하던
사랑의 등짝을
반신 거울에 슬쩍 비춰나 두네
- 유종인 「설치미술」 전문
유종인의 위 시는 정통 서정시의 맥을 잇는 규범적 작품이다. 그렇다고 구태의연하거나 고리타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연에 있는 사물의 표층적 이미지화의 단계를 넘어 ‘소낙비’를 투시함으로써 자신의 내면 심층에 내재해 있는, 자아를 환기시킨다.
시인은 소낙비 속에서 시적 자아를 육화하고, 그 이미지를 다시 외부의 이미지에 중첩시킴으로써 일상의 이미지를 정화시키려고 한다. 가뭄 끝의 소나기를 바라보며 손톱과 발톱을 깎고 있는 화자는, 자기 옆에 나뒹굴고 있는 두터운 책을 댓돌이나 징검돌로 바라보며 묘한 쓸쓸함에 마음이 기운다.
그러나 병풍 같은 소낙비 속에서 책을 ‘댓돌’이나 ‘징검돌’로 바라보는 심사는 단순히 그것들의 유비적 관계에서 벗어나 대상에 다가가거나 건너오는 매개로 바라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점점 잦아드는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야윈 사랑의 뒷모습을 읽어내는 내면의 풍경은, 경험의 영역을 초월한 자리에서 새로운 풍경을 그려낸다.
시인은 소낙비 풍경 속의 모든 사물을 시적으로 인식한다. 작고 하찮은 것을 따뜻하고 그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에 마음을 덧대려고 한다. “종아리를 괜히 쓸어보면/쓸쓸함도 한 물건 같"다고 고백하는 대목에서 이러한 시인의 마음은 잘 드러난다.
‘괜히’라는 부사어에서 드러나는 공연한 쓸쓸함은 시인이 쓸쓸함을 느끼기 이전에 이미 그 자리에 있던 것으로 문법의 시제 논리로는 어긋난다. 그러나 ‘괜히’라는 말이 지닌 어감과 근원적 파장은, 시인이 대상을 마음으로 느끼고 그 의미를 깨우치는 일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쓸쓸함은 물건으로 느낀다하여 감정의 사물화라 한정시키면 시는 오히려 그 의미망이 축소된다. 갑자기 든 서늘한 마음이 이 쓸쓸한의 근거가 되며, 전신 거울도 아닌 반신 거울과 앞이 아닌 뒤의 등짝을 비추는 것은, 그 풍경 안에 내재된 세계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시적 성실함으로 읽어낼 수 있다.
둘러보니 썩은 서어나무 속이다
내가 잎이었는지, 잎의 언저리에 피는 헛꿈이었는지
불우한 생각이 각설탕 태우는 냄새 같은
있다가 사라져버린 것이 나에게 묻는
서어나무 발자국은 길 가운데 멈추고, 서쪽 뿌리에서 어떤 처연한 결기가 걸어나온다
눈을 감아도 네가 내 안에서 눈에 덮여 있는 저녁은 갈까마귀 목덜미 빛이다
그렇게 흘러 너에게 가다보면 나는 조막만 해진 밀랍인형이 될 것이다
결국, 이란 허공의 말이 천천히 지혈되고 있었다
- 문정영 「아스피린」 전문
문정영 역시 독특한 자신만의 시적 감수성을 통해 자연 풍경을 새롭게 변형시키고자 한다. 비록 풍경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가 묘사한 시적 현실은 자연 풍경 그 자체에 머무르진 않는다. 시인만의 상상력과 인식과정, 그리고 미학을 통해 자연 풍경을 내면 풍경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개성적 상상력이 시적 대상에 작용했을 때 표출되는 인식론과 미학은 형이상학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는 아스피린과 서어나무라는 절묘한 결합에서부터 시작된다. 시인이 많은 나무들 중에 왜 서어나무를 선택했을까?
서어나무는 중부이남 지역의 산간이나 해안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낙엽활엽수다. 그러나 공해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 도심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다. 도심에서 물러난 나무는 화자의 불우한 생각을 담아내기에 더없이 좋은 제재이다. 또한 아스피린은 일반적으로 혈관 내에 피가 굳고 뭉치는 혈전을 억제하는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화자는 정작 지혈을 원하고 있다. 달콤한 기억과 불우한 생각의 혼재, 너의 부재의 원인에 대한 혼란 속에서 절망적인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자기반성의 치열성을 담보해내게 된다. 그러면서 화자는 눈 내리는 날의 서어나무와 갈까마귀와의 교감을 통해 시적 일체를 시도한다. 그것들과 일체된 공간 속에서 화자는 외롭고 고독한 마음을 어찌할 도리가 없고, 스스로 감당할 수 밖에 없는, ‘결국’의 상황을 받아들인다. “눈을 감아도 네가 내 안에서 눈에 덮여 있는 저녁은 갈까마귀 목덜미 빛"이라고 고백하며, 시인은 대상을 마음으로 껴안는다.
시인이 이런 내밀한 세계를 드러내는 일은, 아픈 자책을 통해 내면을 풍경으로 그려내는 시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떤 처연한 결기가" 묻어난 치열한 사랑일수록 외롭고 고독한 법임을 시인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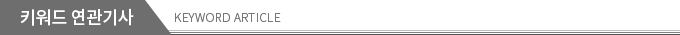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