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의 인기 있는 대서사(代書士)이자 온 동네의 사문서 대필가였던 아버지는 광부와 산판 나무꾼에서 출발해 이발사를 거쳐 미장공과 목수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직업을 거쳐 울산 대일(매암동) 산언덕에 막 세 든 처지였다. 기분 좋을 때 그는 이웃을 불러 막회와 소주와 막걸리를 대접했고, 흥에 겨우면 젓가락 장단은 물론이고 벌떡 일어서서 두 손을 허리께에 붙여 살짝살짝 흔들며 엉덩이춤을 추고는 했다. 이웃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사람이면서도 식구들에게는 불같은 성미여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거나 회초리를 들거나 세간을 내던져 버리거나 부수기까지 했다.
그런 무서운 아버지가 그렇게도 선망하던 침대를 만들어 준다는 데에 나는 놀라 기겁을 했다. 혹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가령 어린 내게 대체 불가능한 교환가치인 침대에 상응하는 성적표를 요구한다거나, 그 요구에 호응하지 못할 경우 닥칠 가혹한 체벌 같은 것 말이다. 원래 큰 포상 다음에 내리는 처벌이 무서운 법이다. 억양법(抑揚法)이란 수사법도 있지 않은가. 아무튼 그날 오후 ‘용석이네’ 마당은 톱질과 대패질, 끌질, 사포질, 망치질, 못질로 쓱쓱 딱딱 쿵쿵 분주하고 즐거웠다. 아, 그날은 국민학교 6학년 내 절정의 하루였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어떤 불길한 기운은 스멀스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가수 혜은이가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한강교 밑을~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서 마음을 싣고서~"(길옥윤 작사ㆍ작곡, 「제3한강교」(현재 한남대교), 1979)를 외치며 산뜻하게 춤출 때였다. 노랫말처럼 아버지는 ‘피어나는 꽃처럼 이 밤을 맴돌다’가 ‘새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 가 버렸다. 무엇이 그를 떠나게 했는지, 어떤 사정이 아직 어린 아들딸을 두고 젊은 아내 곁을 떠나게 했는지 알 수는 없었다. 나는 다만 그의 부재 혹은 ‘무서움’의 절대적 부재가 고통스러웠다.
나는 아버지의 부재를 만회하겠다는 듯 그 침대 위에서 내려설 의욕을 갖지 않았다. 씻고 먹고 학교 가는 시간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시간을 그 위에서 지냈다. 풍성한 매트리스도 예쁜 장식도 없는 각목과 합판으로 만들어진 침대 위에서 여름방학을 나고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았다. 그의 부재를 통해 나는 어떤 근본적 상실감을 맛보았다. 불가항력의 상실감은 어린 내게 항상적인 우울로 나타났다. 우울한 어린 열세자(劣勢者)는 부재를 만회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찾아 나섰다. 심지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한 동네 아저씨의 텅 빈 격려에도 위로를 받고는 했다.
아버지는 유난히 김추자와 혜은이를 좋아했다. 김추자의 독특한 음색과 분위기를 자주 들었으며, 혜은이의 발랄한 춤과 경쾌한 리듬에 장단을 맞추고는 했다. 물론 존 웨인(John Wayne, 1907-1979)과 버트 랭캐스터(Burt Lancaster, 1913-1994)와 잉그리드 버그먼(Ingrid Bergman, 1915-1982)을 선망했고, 술자리에선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 1935-1977)의 「Can't Help Falling In Love」와 바비 빈튼(Bobby Vinton, 1941- )의 「Mr. Lonely」를 목청껏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래도 나긋나긋한 젊은 여가수의 노래를 더 즐겼다. 그런 취향은 그대로 내게 복사되어 어린 나는 ‘10대 가수 가요제’를 손꼽아 기다리고는 했다.
나는 한때 김추자와 혜은이를 거부하며 살았다. 그들의 노래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나를 저 절대적 부재의 80년대로 강제 소환하기 때문이다. 국민학교 6학년 어린 나의 상실감은 시시각각 출몰하면서 오래도록 나를 괴롭혔다. 가령 혜은이의 [당신만을 사랑해」나 「독백」은 여전히 내게 아버지의 이미지와 오버랩 되면서 시계를 불현 듯 1980년으로 되돌려 놓는다. 적어도 내게 김추자와 혜은이는 ‘학생 경주 김공 희철’(學生慶州金公希徹)의 현현과도 같다. 또한 각목과 합판으로 만들어진 그 멋대가리 없는 침대의 부활과도 같다.
만일 시를 영광의 표상이 아니라 상처의 치유라고 할 수 있다면 내게 시는 필연적이었다. 아버지의 부재는 분명 상처였던 까닭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김추자와 혜은이를 즐겨 듣는다. 이제는 그들을 듣는 것이 위안이다. 그들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톱질과 못질을 떠올리고 침대를 떠올리고 대일을 떠올리는 것이 위로다. 20년 전부터 아버지는 진짜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시는 위안과 위로의 필요를 채우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인가.
김추자와 혜은이는 시인이 아니며 그들의 노랫말도 시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로 하여 사적(私的)이어서 소중한 나의 상실의 80년대를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행불행과 상관없이 나는 나의 삶을 견디고 있으며, 그들의 노래는 그래서 내게 소중한 에너지원이다. 미당 서정주(1915-2000)의 『화사집(花蛇集)』 발문에 이런 글귀가 보인다. “시를 사랑하는 것은, 시를 생산하는 사람보다도 불행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선 시를 사랑하고 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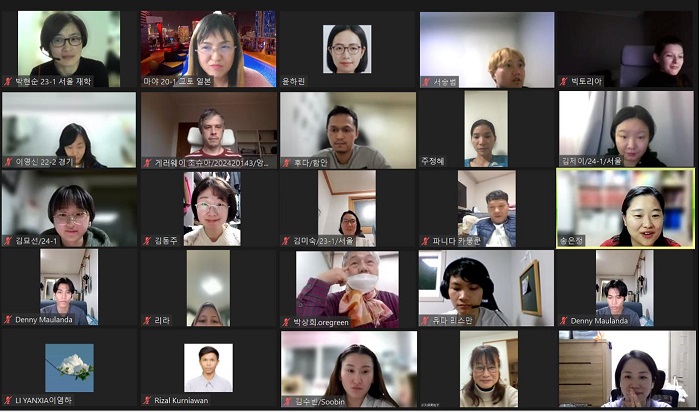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