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군 황지읍 혈리’의 집은 사라졌다.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석포리’의 집도 사라졌다. 울산 장생포의 집도 대일의 집도 지금은 없다. 생계를 잇고자 남행을 거듭하며 살던 집들은 이젠 모두 사라졌다. 사람들도 서로 흩어졌다. 유목민의 바이칼과 아무르가 기억에서 기억으로 전해지듯 내가 살던 집과 이웃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니라 기억이 되었다. 기억은 시간을 타고 산일되면서 몇 장의 스틸 컷으로 정착되므로 불가항력의 남행 혹은 이별은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유목민의 이동이 가축과 목초지와 기후의 상관관계 속에 양식화된 일종의 구조적 행위라면 그것은 진정한 유목이 아니다. 생계를 위한 취업과 구직이 공단과 도시를 향한 단방향의 이동이라면 그것 또한 진정한 노마드가 아니다.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와 가타리(Felix Guattari, 1930-1992)의 참다운 노마드는 ‘고른판(plan de consistance)’ 위에서 운동하는 무한한 특이점을 함축한 다양체, 즉 ‘기관 없는 신체’이다. 예측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우발성이 인간의 자유라면 우리 가족의 남행과 이별은 어쩌면 완강한 구속이었다.
그들은 나의 시우(詩友)이자 도반이자 동반자다. 그들은 철학과 역사의 거봉들을 사숙한 인문주의자이자 음악과 회화와 건축을 향수하는 미학자들이다. 그들은 빛나는 황금의 사원이 아니라 천정이 숭숭 뚫린 움막을 찾는 사람들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노래를 선택한 사람들이며, 그들의 노래는 언제나 행진곡이기보다 진혼곡이다. 그들을 일컬어 ‘겨울숲’이라고 불렀다. 주목되지 않는 지역 문단의 어두운 구석일망정 시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분출하던 사람들이다.
비 오는 저녁, 이제는 ‘지난 겨울숲’이 된 그들과의 만남은 유쾌하지도 우울하지도 않았다. 시와 시집과 아이들 얘기가 잠깐 나왔다 들어갔고, 건강과 섭생과 행불행과 미래의 안부를 물었다. ‘겨울숲’으로 2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너나없이 중년을 넘어 초로(初老)를 향하고 있기에 어쩌면 더는 놀랄 일도 없었다. 누구는 아이를 키워 대학에 보냈고, 누구는 결혼을 시켜 손주를 보았다. 겪을 만큼 겪었다. 그러므로 그들과의 만남은 유쾌할 필요도 없었고 우울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느꼈다. 이제 더 이상 짧은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시로써 서로를 묶어주던 보이지 않는 끈이 풀어진 것을. 우리는 여전히 시인들이며 시로써 세상을 살아갈 것이지만, 더는 예전의 시적 분위기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를 자극하던 시적 생산성은 이제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겨울숲’이라는 묶음은 과거 시제가 되었다. 시가 중심이 되고, 시가 소통의 핵심이 되어 서로를 묶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시는 다른 무엇들 속의 하나에 불과해졌다.
‘남행 혹은 이별’을 고통으로 느끼며 예측할 수 없는 우발성의 자유를 누리겠다고 떠난 나는 ‘겨울숲’의 이별이 항상성을 띠게 되었음을 느끼며 몸서리쳤다. 떠난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나기 때문이다. 나는 시를 빌미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겨울숲’에게도 나의 과격한 시적 언사는 무례를 넘어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헤어지고 싶지 않은 동지들과의 이별을 느끼며 오래도록 그들을 기억하고 안타까워 할 것이 슬펐다.
가만 생각하면 살던 집만 사라진 게 아니다. 집들의 기억도 조금씩 사라졌다. 친구들도 사라졌다. 사는 곳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친구들은 있어도 사라진 것이다. 친척들도 사라졌다. 명절이나 애경사(哀慶事) 때 만나는 친척과의 섬처럼 무거운 고립감은 그 사라짐의 명확한 증거다. 서로를 자극하는 접점이 긴장을 유지하지 않는 어떤 관계도 묶음이 아니라 단절이다. 그런 점에서 ‘겨울숲’과의 이별은 물리적 단절이기보다 시적 자극의 중단이기에 더욱 안타까웠다. ‘겨울숲’은 그만큼 시적 긴장과 욕망과 생명력의 보고였던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의 시세계를 궁금해 할 것이며, 각자의 시적 행로를 염려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더욱 ‘지난' 겨울숲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비록 현재적 묶음으로 살아 있는 동아리는 아니어도 지난 기억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오래 묵은 숲이 되기를 기원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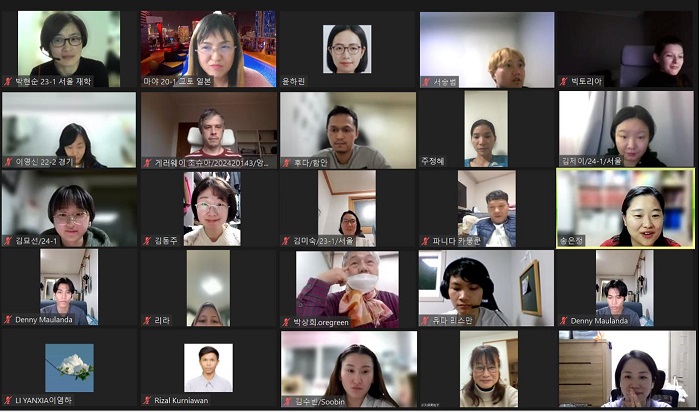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