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혼돈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단지 ‘그’가 언제 올지 알 수 없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예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이다. 시의 출발점은 언제나 혼돈 속에서 우발적으로 솟아나는 어떤 순간이다. 그것은 시인이 끌어내는 에너지가 아니라 시인을 이끌어가는 에너지다. 그가 시인에게 작용하는 것이지 시인이 그를 유도하는 게 아니다. 어쩌면 시적 순간이야말로 비인칭적 인칭이거나 비주체적인 주체성이다.
시적 순간이 우발적이라고 하여 시가 예측할 수 없는 우연과 무질서의 체계라는 말은 아니다. 시와 시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며, 시에는 장구한 시의 역사를 통해 구축된 정밀한 체계가 엄존한다. 비록 산문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정서적 반응을 촉발하는 예리한 시적 언어는 있는 것이며, 시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전혀 시적이지 않은 외형만의 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아무리 짧아도 시가 될 수 있으며, 아무리 길어도 시가 될 수 있다. 행과 연이 없어도 시가 될 수 있으며, 있어도 시가 될 수 있다. 시에는 분명한 형식적 체계가 있다.
그러나 시와 시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런 형식성에 있지 않다. 시를 시이게끔 하는 것은 시적 순간이 시인에게 전한 그 말, 바로 그 '무엇'이다. 그가 언제 올지 알 수 없고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전하는 그 순간의 언어가 시의 핵심을 이룬다. 그리고 그 핵심은 시 양식의 정수리에서 밝게 빛나는 영광의 왕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인은 언제나 ‘기다리는 존재’인지 모른다. 혼돈 혹은 우발이라는 에너지를 기다리는 시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전하는 ‘무엇’을 받아 적을 수 있는 항상적인 ‘깨어 있음’이다.
참다운 시인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더라도 ‘그’를 기다린다.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잠잘 때도 시인은 혼돈과 우발의 순간, 그가 전하는 말을 기록하기 위해 언제나 깨어 있다. 만일 시인을 감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런 ‘깨어 있음’을 지칭한 것일 터다. 시인은 모든 감각 기관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가동시키는 연중무휴의 감각 공장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종종 현실의 생활공간에 부적응한 듯 보이거나 지나치게 몽상적으로 비친다거나 과민한 감각 기계로서 불화를 촉발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인지 모른다.
치킨집 ‘사이’에서 늘 깨어 있는 또 다른 ‘기다리는 존재’를 만났다. 이 후배 시인 역시 부적응한 듯 보이고 몽상적으로 보이고 과민한 듯 보인다. 그는 ‘그’를 기다리는 연중무휴의 감각 공장이면서 동시에 꽤 유능한 연구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작정한 듯 ‘형의 시풍(詩風)이 예전 같지 않다.’며 자신은 ‘그 변한 시가 싫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면서 몇 줄만 읽어도 마음에 새겨지던 ‘서정적 리얼리즘’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삼촌을 버린 여자와
삼촌이 버린 세상의 끝에서
처마는 돌담에 기대어 주인을 추억하고
바다는 지치지도 않고 밤새
마을이 끝난 곳에서 주름져 있다
- 졸시, 「처용암에서」 중에서
그의 진심을 모르지 않는다. 그와 나는 고등학교 동문으로 이미 청소년기에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며 ‘청년 문사’로서 겉멋을 공유한 처지다. 어쩌면 문단의 ‘특수 관계자’인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표현주의자의 과격한 지적 언어가 아니라 심중에 천만 근 쇳덩이를 던져 주는 정통 서정의 언어로 돌아오라는 요청이었을 것이다. 그가 생맥주 한잔을 들이키며 직접 인용한 나의 졸시 「처용암에서」가 정통 서정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는 독자와 더 폭넓게 소통하는 시인이 되어 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가 언제 올지 알 수 없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예상할 수 없다. 그가 내게 작용하는 것이지 내가 그를 유도하는 게 아니다. 나의 ‘시적 순간’은 언제나 비인칭적이며 비주체적이다. 문단의 일반적 분위기와 달리 자신의 진심을 그대로 내게 말해 준 고마운 후배 시인에게도 분명히 밝혔다. 나는 쓰는 시인이 아니라 받아 적는 사람이라고. 서정적 리얼리즘에서 표현주의자의 지적 언어로 이동한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그’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고.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금기를 어겨 그의 말을 기록하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지치지 않고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다. 생활인이기에 세간(世間)이 요구하는 책임을 다하려 직장을 다니고 또 다른 직장을 찾으면서도 진정으로 내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그'의 말이다.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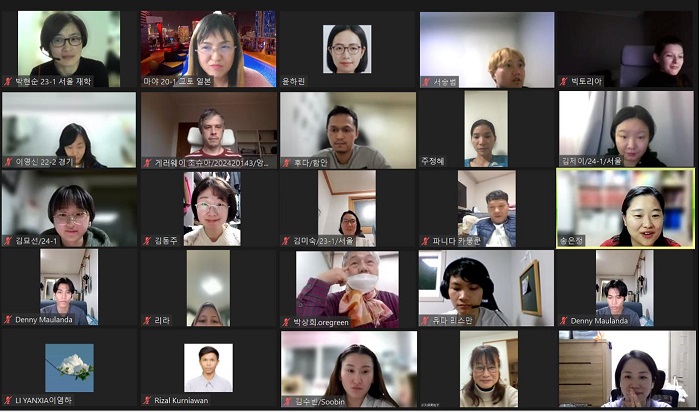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