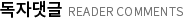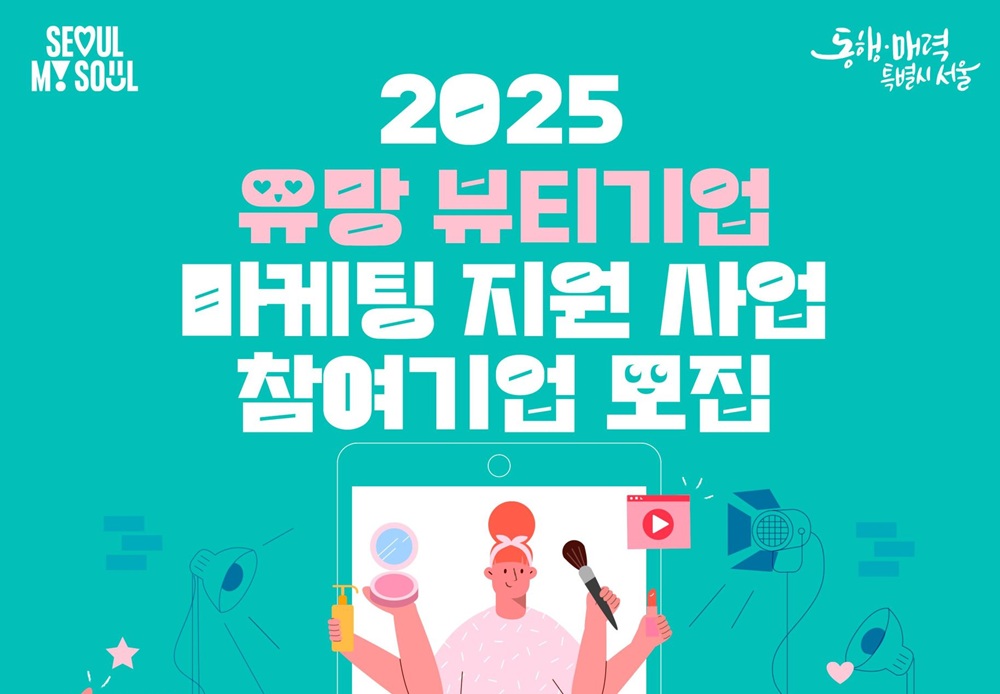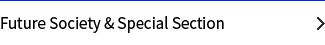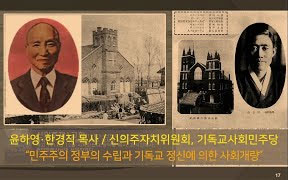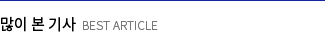급속한 고령화로 복지분야 예산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기획재정부가 9월 15일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올해 106조7000억원(본예산 기준)에서 2023년 150조2000억원으로 40조원(연평균 8.9%)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원인은 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다.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大) 공적연금의 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의무지출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까지 연평균 30만명대 수준으로 증가해왔는데 2020년에는 44만명, 2021년 41만2000명, 2022년 43만8000명, 2023년 47만2000명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된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복지분야 의무지출 규모와 관련해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107조원에서 2030년 185조3000억원, 2040년 262조7000억원, 2050년에는 347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3.9%씩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GDP 규모와 비교할 때 올해 5.7%에서 2050년에는 10.4%로 늘어난다. 증가속도는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2.5%),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3.1%)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 또한 인구고령화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급증하는 배경으로는 첫째 국민연금의 연금수급자 수 증가로 연금급여액(올해 23조원→2050년 160조원·연평균 6.4%) 급증, 둘째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한 급여비 증가(올해 24조원→ 2050년 60조원), 셋째 노인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올해 30조→2050년 57조) 증가 등이 꼽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련해 올해는 7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내년에는 6조6000억원 적자로 전환한 뒤 2050년에는 237조4000억원(GDP대비 ?7.1%)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해가 거듭할수록 적자폭이 증가하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2050년 GDP 대비 85.6%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다.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들어섰다. 고령인구 20%를 넘을 때는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25년경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우리보다 20여년 앞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일본의 복지분야 의무지출 규모는 더욱 큰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 사회에 1994년 고령사회에, 200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올해 일본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고령인구 관련 사회복지지출은 내년 GDP 대비 18.9%에서 2050년 21.7%로 확대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까지 연평균 30만명대 수준으로 증가해왔는데 2020년에는 44만명, 2021년 41만2000명, 2022년 43만8000명, 2023년 47만2000명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된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복지분야 의무지출 규모와 관련해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107조원에서 2030년 185조3000억원, 2040년 262조7000억원, 2050년에는 347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3.9%씩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GDP 규모와 비교할 때 올해 5.7%에서 2050년에는 10.4%로 늘어난다. 증가속도는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2.5%),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3.1%)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 또한 인구고령화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급증하는 배경으로는 첫째 국민연금의 연금수급자 수 증가로 연금급여액(올해 23조원→2050년 160조원·연평균 6.4%) 급증, 둘째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한 급여비 증가(올해 24조원→ 2050년 60조원), 셋째 노인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올해 30조→2050년 57조) 증가 등이 꼽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련해 올해는 7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내년에는 6조6000억원 적자로 전환한 뒤 2050년에는 237조4000억원(GDP대비 ?7.1%)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해가 거듭할수록 적자폭이 증가하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2050년 GDP 대비 85.6%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다.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들어섰다. 고령인구 20%를 넘을 때는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25년경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우리보다 20여년 앞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일본의 복지분야 의무지출 규모는 더욱 큰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 사회에 1994년 고령사회에, 200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올해 일본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고령인구 관련 사회복지지출은 내년 GDP 대비 18.9%에서 2050년 21.7%로 확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상준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최근 발간한 저서 '불황탈출'에서 "1991년 일본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약 50%였으나 2000년에 100%를 넘었고, 200%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1년에 불과하다"면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난 것은 경기가 나쁠 때는 어떤 수단을 써도 정부지출을 초과하는 조세수입을 얻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그동안 GDP 대비 200%가 넘는 부채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정부부채 대부분을 일본인들의 예금을 원천으로 한 일본 국내 금융기관이 매입했기 때문"이라며 "일본 가계의 순금융자산은 일본 GDP의 250%를 뛰어넘는 규모지만 한국은 GDP의 100%를 겨우 넘는 정도여서 정부부채가 GDP대비 70%만 돼도 안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것인 만큼 효율적으로 정부예산을 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그동안 GDP 대비 200%가 넘는 부채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정부부채 대부분을 일본인들의 예금을 원천으로 한 일본 국내 금융기관이 매입했기 때문"이라며 "일본 가계의 순금융자산은 일본 GDP의 250%를 뛰어넘는 규모지만 한국은 GDP의 100%를 겨우 넘는 정도여서 정부부채가 GDP대비 70%만 돼도 안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것인 만큼 효율적으로 정부예산을 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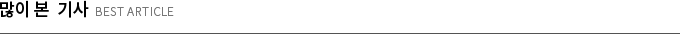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