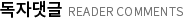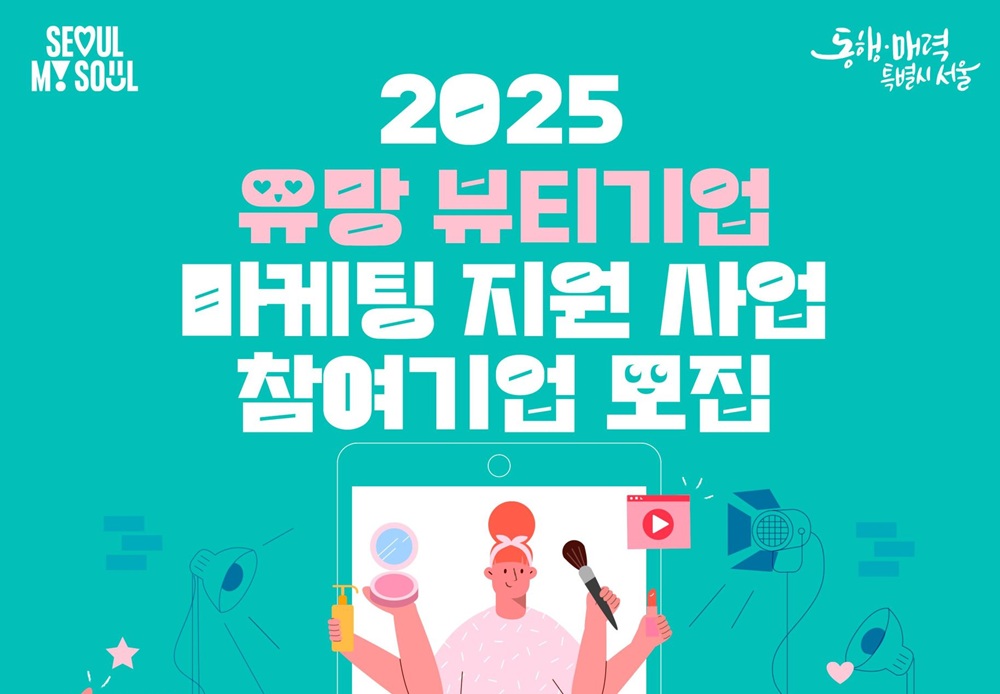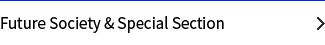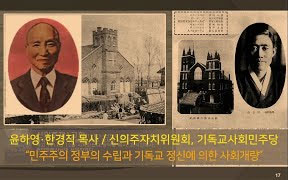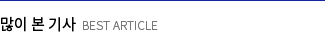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입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비중이 최근 3년 사이 13%대에서 11%대로 줄어든 반면, 국민이 낸 보험료 비중은 8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면 20조원이 넘는 누적적립금을 우선 사용하되 보험료 인상과 함께 적정 규모의 국고지원 법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7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7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국고지원금의 비중은 2010년 14.3%에서 2013년 12.3%까지 낮아졌다가 2015년 13.3%로 높아진 이후 2016년부터 지난해(잠정치)까지 3년 연속 12.6%, 11.7%, 11.4% 등으로 낮아졌다. 이 기간 국고지원금은 7092억원, 6775억원, 7071억원이었다.
반대로 매월 국민이 낸 보험료 비중은 지난해(잠정치) 86.4%(5조3642억원)에 달했다. 2014년 82.3%(4조1594억원)에서 2015년 83.2%(4조4330억원), 2016년 84.3%(4조7593억원), 2017년 86.2%(5조417억원)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고 2007년 65.0%에서 2017년 62.7%까지 떨어진 보장률을 임기 내인 2022년까지 70%로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관건은 ‘돈’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에서 2023년까지 5년간 41조5842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재정운영 목표를 세웠다. 보험료율 연평균 3.2% 수준에서 관리, 2023년 이후 누적 적립금 10조원 이상 유지, 정부지원 비율 확대 등이 큰 틀이다.
좀 더 구체적인 재정 전망치를 보면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49%, 2023년부터 3.2%씩 전년보다 인상하고 수가인상률을 올해부터 2.37%로 적용하는데 정작 보험료 수입 대비 정부지원 비율은 13.6%로 고정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지원 비율이란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 과정에서 2017년 말 20조원이 넘는 누적 적립금을 활용한다지만 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을 지는 국민과 달리 정부의 추가 부담 의지엔 의문 부호가 달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정 교수는 "건강보험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정부가 일정부분을 국고·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보험료만으로는 전체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한 재원이 충당될 수 없는 현실 여건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금 노동자들은 비임금 노동자의 낮은 소득파악률을 이유로, 경영자들은 고용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보험료 인상보다는 국고지원을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누적적립금으로 초기 비용을 사용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적정 규모의 국고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 교수는 “지원 규모를 ‘과거 3년 평균·전전년도의 보험료 수입·보험자부담분의 100분의 14를 국고에서, 100분의 6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한다’는 식으로 명확히 하거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차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는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대로 매월 국민이 낸 보험료 비중은 지난해(잠정치) 86.4%(5조3642억원)에 달했다. 2014년 82.3%(4조1594억원)에서 2015년 83.2%(4조4330억원), 2016년 84.3%(4조7593억원), 2017년 86.2%(5조417억원)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고 2007년 65.0%에서 2017년 62.7%까지 떨어진 보장률을 임기 내인 2022년까지 70%로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관건은 ‘돈’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에서 2023년까지 5년간 41조5842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재정운영 목표를 세웠다. 보험료율 연평균 3.2% 수준에서 관리, 2023년 이후 누적 적립금 10조원 이상 유지, 정부지원 비율 확대 등이 큰 틀이다.
좀 더 구체적인 재정 전망치를 보면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49%, 2023년부터 3.2%씩 전년보다 인상하고 수가인상률을 올해부터 2.37%로 적용하는데 정작 보험료 수입 대비 정부지원 비율은 13.6%로 고정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지원 비율이란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 과정에서 2017년 말 20조원이 넘는 누적 적립금을 활용한다지만 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을 지는 국민과 달리 정부의 추가 부담 의지엔 의문 부호가 달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정 교수는 "건강보험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정부가 일정부분을 국고·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보험료만으로는 전체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한 재원이 충당될 수 없는 현실 여건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금 노동자들은 비임금 노동자의 낮은 소득파악률을 이유로, 경영자들은 고용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보험료 인상보다는 국고지원을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누적적립금으로 초기 비용을 사용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적정 규모의 국고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 교수는 “지원 규모를 ‘과거 3년 평균·전전년도의 보험료 수입·보험자부담분의 100분의 14를 국고에서, 100분의 6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한다’는 식으로 명확히 하거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차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는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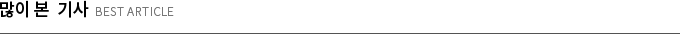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