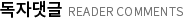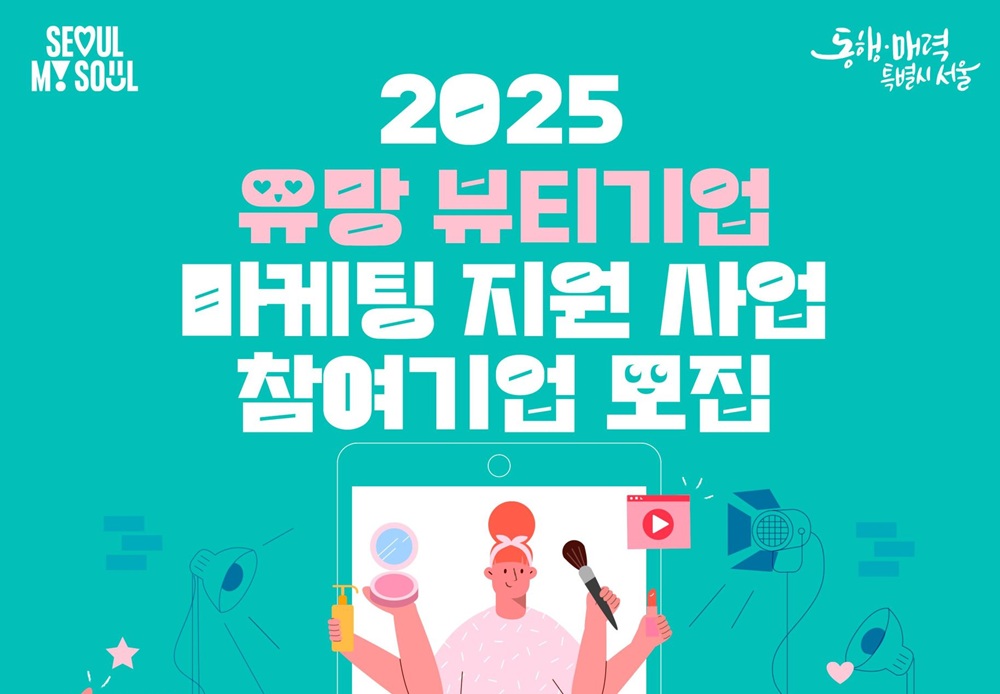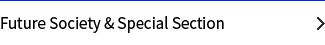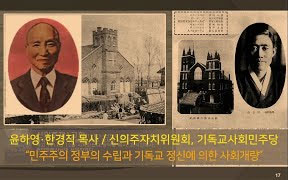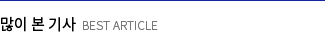오래 전 ‘먹고 살기’ 위해 배움을 포기해야 했던 시절, 야학(夜學)이라는 게 있었다. 1970~80년대 당시 빈민층·노동자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강점기까지 닿는다. 그 무렵 민족계몽을 맡았던 게 바로 야학이었다.
조선일보가 현재 남아있는 서울 시내 야학 현장을 취재, 7월 25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대신야학’은 지난 38년 동안 1000명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한다. 현재는 두 반에 38명이 재학 중이다.
야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여전히 검정고시 응시와 합격이 목표다. 전성하 전국야학협의회 대외협력처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배울 때를 놓쳤으면서 저녁에만 시간을 낼 수 있고 사설 학원 강의 속도는 따라가기 힘든 어르신들이 주로 야학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글을 몰라, 또는 최소한의 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 야학을 찾았던 것과 달리 최근 들어서는 야학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한다. 서울 중랑구 묵동 '태청야학'의 정윤이 연구부장은 "공부 외에도 학창 시절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이 야학에선 매년 9월 학생 전원이 교복을 빌려 입고 1박 2일 경주나 제주도 등으로 수학여행을 간다. 영화와 공연 관람, 체육대회, 졸업 여행 등 각종 친목 행사가 1년 내내 이어진다. 다시 말해 과거 학창시절을 재현(再現)하는 ‘향수(鄕愁)’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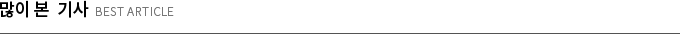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