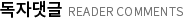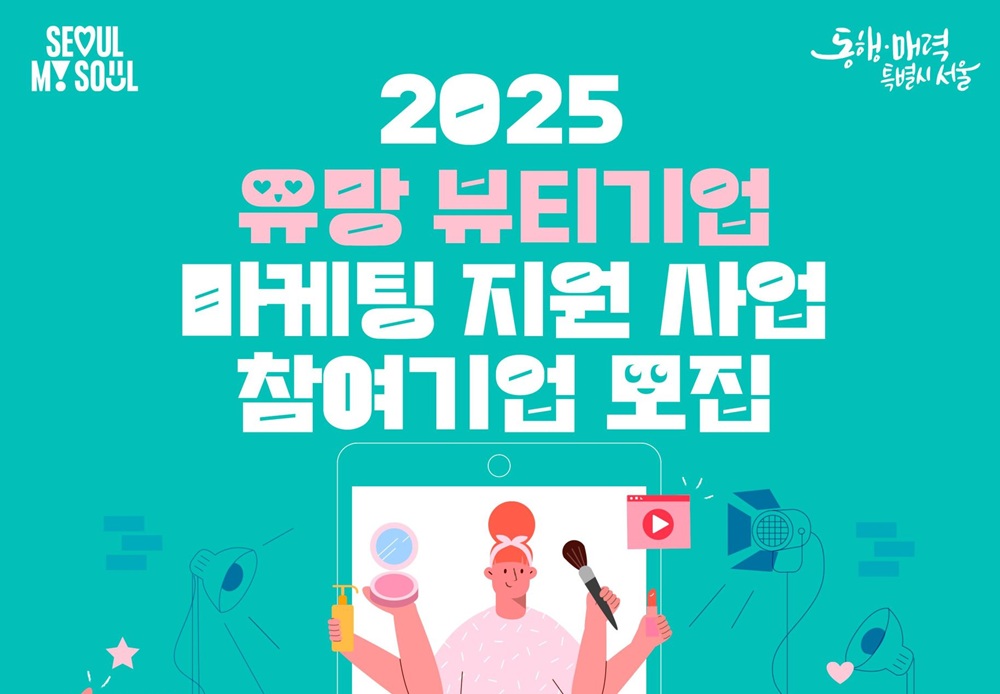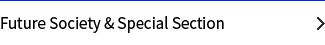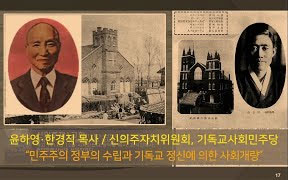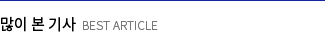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중 무역 분쟁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0.4%포인트(p) 낮췄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은행 조사국이 미중(美中)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양국의 관세 부과가 한국의 중간재 수출을 직접 제약하는 한편 미중의 내수 둔화가 한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 경로를 통한 영향'으로 0.2%p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 분쟁 심화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 주체의 관망 행태 경향이 증가하고 투자·소비 등 기업 및 가계의 경제 활동이 둔화하는 '불확실성 경로를 통한 영향'이 나머지 0.2%p다.
이 총재는 지난 10월18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재무장관 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중 양국 수출 비중이 워낙 커 두 나라가 붙은 분쟁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면서 "0.4%p는 결코 작지 않다. 미국과 중국 양 당사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는 "여기에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 부진까지 가세했다. 한국 기업의 설비 투자도 반도체와 연관이 큰데 반도체 경기가 나쁘니 수출도 부진하다"면서 "올 한 해 성장률 둔화는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 대외 요인 악화 탓이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내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에스컬레이트(Escalate·악화)하지 않는다는 기대는 있다"면서도 미중 분쟁으로 인한 악영향이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양국이 취한 관세 인상 등 조치가 상당 기간 이어져 내년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다.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면 내년에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내년 경제에도 계속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수출 규제는 아직 큰 영향이 없었다"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내년 전망을 아직 안 내놔 (아직 모르겠다). 그것(내년 전망)은 다음 달에 하면서 일본 영향을 어떻게 볼지 고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을 지닌 직면 과제로 '대외 불확실성'을 꼽았다.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경기 모두 올해보다 내년이 낫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지만 실제 긍정적으로 내다보기는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금까지 전망해왔던 것이 예상을 벗어나서 안 좋은 쪽으로 갔다"면서 "현재로서는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어떻게든 잘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양국의 관세 부과가 한국의 중간재 수출을 직접 제약하는 한편 미중의 내수 둔화가 한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 경로를 통한 영향'으로 0.2%p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 분쟁 심화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 주체의 관망 행태 경향이 증가하고 투자·소비 등 기업 및 가계의 경제 활동이 둔화하는 '불확실성 경로를 통한 영향'이 나머지 0.2%p다.
이 총재는 지난 10월18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재무장관 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중 양국 수출 비중이 워낙 커 두 나라가 붙은 분쟁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면서 "0.4%p는 결코 작지 않다. 미국과 중국 양 당사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는 "여기에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 부진까지 가세했다. 한국 기업의 설비 투자도 반도체와 연관이 큰데 반도체 경기가 나쁘니 수출도 부진하다"면서 "올 한 해 성장률 둔화는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 대외 요인 악화 탓이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내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에스컬레이트(Escalate·악화)하지 않는다는 기대는 있다"면서도 미중 분쟁으로 인한 악영향이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양국이 취한 관세 인상 등 조치가 상당 기간 이어져 내년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다.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면 내년에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내년 경제에도 계속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수출 규제는 아직 큰 영향이 없었다"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내년 전망을 아직 안 내놔 (아직 모르겠다). 그것(내년 전망)은 다음 달에 하면서 일본 영향을 어떻게 볼지 고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을 지닌 직면 과제로 '대외 불확실성'을 꼽았다.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경기 모두 올해보다 내년이 낫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지만 실제 긍정적으로 내다보기는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금까지 전망해왔던 것이 예상을 벗어나서 안 좋은 쪽으로 갔다"면서 "현재로서는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어떻게든 잘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이 총재는 국내 저물가 현상과 관련해 "물가 안정 목표제를 선택한 세계 43개국 중 아이슬란드를 빼고는 모두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Inflation·물가 상승)율이 낮은 게 세계 중앙은행의 가장 큰 골칫거리다. 한국이 과연 제로(Zero·0) 금리까지 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 정책으로 물가를 컨트롤(Control·통제)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1일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 집계(1965년)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0월16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전격 인하하고 나섰다.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총재는 "지금도 물가 수준과 경기 상황을 보면 금리를 낮출 상황이 됐다. 그런데 과연 한국이 긴축적이냐. 지금이 긴축적인 수준이라면 곤란하다"면서 "현재 금리도 1.25%로 아주 낮은데 제로 금리까지 갈 수 있느냐(는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들 리세션(Recession·경기 침체)을 얘기한다. 막상 리세션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중앙은행이 정책 수단(금리 인하 여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진짜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하므로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내년 경제가 잠재 성장률(2.5%)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현재의) 저금리를 빨리 정상화해놔야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그래야 정말 어려울 때 다시 대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과거 두 차례의 금리 인상(2017년 11월·2018년 11월)과 관련한 일각의 비판을 두고서는 "그때 올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싶다.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 총재는 ‘통화 정책을 더 완화적으로 펼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경기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부작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소수 의견도 나오는 것이고 (섣불리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0%의 물가 상승률은 한두 달 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저물가에 크게 기여했던 기조 효과가 12월부터 약해진다는 판단에서다. 근원물가는 내년에 들어서야 1%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지금도 물가 수준과 경기 상황을 보면 금리를 낮출 상황이 됐다. 그런데 과연 한국이 긴축적이냐. 지금이 긴축적인 수준이라면 곤란하다"면서 "현재 금리도 1.25%로 아주 낮은데 제로 금리까지 갈 수 있느냐(는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들 리세션(Recession·경기 침체)을 얘기한다. 막상 리세션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중앙은행이 정책 수단(금리 인하 여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진짜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하므로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내년 경제가 잠재 성장률(2.5%)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현재의) 저금리를 빨리 정상화해놔야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그래야 정말 어려울 때 다시 대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과거 두 차례의 금리 인상(2017년 11월·2018년 11월)과 관련한 일각의 비판을 두고서는 "그때 올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싶다.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 총재는 ‘통화 정책을 더 완화적으로 펼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경기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부작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소수 의견도 나오는 것이고 (섣불리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0%의 물가 상승률은 한두 달 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저물가에 크게 기여했던 기조 효과가 12월부터 약해진다는 판단에서다. 근원물가는 내년에 들어서야 1%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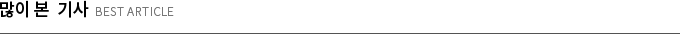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