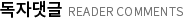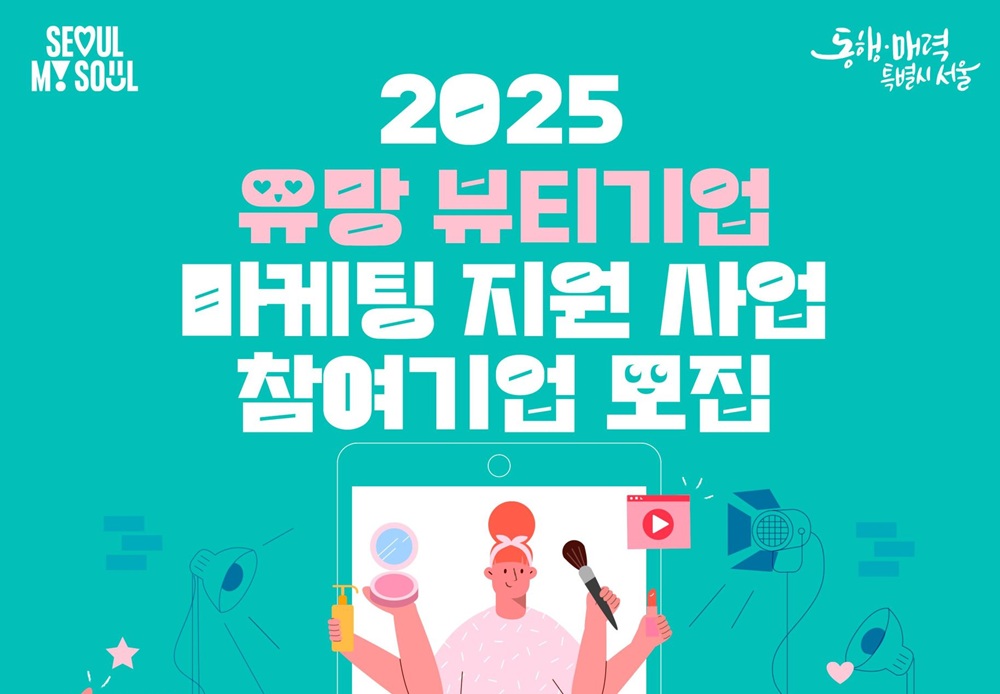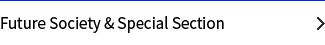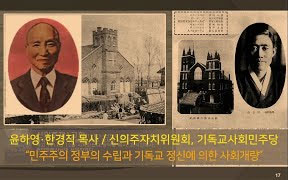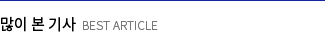직장을 다니는 기혼 여성의 우울감이 일·가정 사이의 갈등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기혼 직장여성의 가족관련 가치관이 일·가정 양립 갈등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과 일·가정 양립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2307명의 직장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직장여성의 우울의 평균은 1.356점, 2014년 1.596점, 2016년 1.944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가정 양립 갈등은 2.058점, 2.171점, 2.344점으로 늘었다.
성정혜 경북대 아동학부 외래교수는 "점수 자체로는 높낮이를 판단할 수 없지만 일·가정 양립 갈등이 늘어남에 따라 직장 여성들의 우울 지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직장 여성의 성역할 가치관과 우울지수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다. 가족 내 성평등한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아 평등을 추구할수록 일·가정 양립 갈등이 낮아지고, 낮아진 일·가정 양립 갈등은 우울을 감소시켰다.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가치관도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자녀 부양에 있어 경제적 책임감이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 갈등이 낮아지고 이 역시 우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직장여성이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해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자녀부양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자신의 직장생활이 가정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해 일과 가정 간에서 발생하게 되는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가정 양립 갈등이 높아질수록 직장여성의 우울은 높아지고, 높아진 우울은 다시 일·가정 양립 갈등을 증가시켰다.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0.9%로 2017년 50.8%와 비교해 아주 소폭 상승했다. 그래도 여성 두 명 중 한 명은 직업이 있다는 의미다.
반면 연령별로 보면 25~29세 여성의 고용률은 70.9%에 달하지만 30~34세 62.5%, 35~39세 59.2%로 감소했다. 경력을 단절한 사유로는 결혼이 34.3%로 가장 많았고 육아 33.5%, 임신 및 출산 24.1%, 가족 돌봄 4.2% 자녀교육 3.8% 순이었다. 항목은 다르지만 모두 일·가정 양립과 관계된 사유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의 학교적응은 물론 자녀의 주의력이나 정서·행동통제력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신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더 중요하게 적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지나친 관심과 통제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부담과 거부감을 갖게 했다.
아동에게 시야를 확장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안정적으로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가정의 경제적 환경(물리적 기능)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동의 주의력이나 인지·정서·행동 통제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적절한 학습기회와 자극, 안락한 물리적 환경이 제공되지 않으면 학교 적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연구진은 방과 후 가정에서의 물리적 환경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방과후 수업·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봤다. 연구진은 연구결과를 두고 처음 사회화 학습단계에 들어선 초등학교 신입생들에 대해 "여러 가정환경 요소를 고려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학교적응도와 무관하게 나타난 배경으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초등 돌봄교실 지원 강화, 탄력근무제, 남성 육아휴직 정책을 기울여 정책적 노력이 일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침에 자녀 등교와 숙제, 각종 행사 등이 늘어나며 워킹맘들이 겪는 부가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가가 자녀의 사회화와 부모세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소득 안정 등 노동권 보장 정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와 전 박사는 또한 최근 교권보호와 관련해 '퇴근 후 카톡금지' 등 쟁점은 있지만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학부모·보호자 등과 보다 긴밀한 소통관계를 구축하는 체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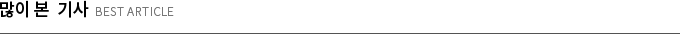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