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아침 나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이다. 부뚜막 코쿨 곁에서 온기를 쬐던 정든 까치구멍집을 떠난다는 생각에 알 수 없는 아쉬움과 서러운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책과 공책을 싸고 옷가지를 담으며 점점 부피가 늘어나는 가방과 함께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거꾸로 매달렸던 외양간의 누렁이와 닭장의 병아리들과 인사를 나누고, 매섭게 콧등을 쪼았던 장닭과도 이별을 고했을 것이다. 천궁(川芎)과 쪽파를 심어놓은 작은 터앝과 비탈진 감자밭, 언덕바지 소나무에 걸어 둔 그네와도 작별을.
그날 밤 어린 나는 쉬지 않고 들려오는 쇠북 소리 혹은 천둥소리에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곳에서 쉬지 않고 들려오는 귀청을 때리는 거대한 소리. 일정한 높이에서 들려오는 예측되는 소리가 아니라 높낮이가 수시로 바뀌고 뒤틀리는 뒤죽박죽 얽히고설킨 커다란 괴성 때문에 도저히 잠들 수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 저녁이 다 되어 도착한 고단한 어린아이를 공포에 떨게 한 것은 울산 장생포 앞바다의 파도였다.
나의 장생포는 시커먼 밤 어디선가 쉬지 않고 들려오는 지독히 무서운 소리였다. 태어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산골 소년에게 바다는 먼저 그 소리가 아니라 장쾌하고 푸른 시각 정보로 나타났어야 했다. 열 살이 되도록 들은 소리라고는 산판의 아름드리나무가 쩌렁쩌렁 울어대는 도끼질 소리뿐이었다. 한참 동안의 도끼질 끝에 이윽고 그 나무의 맨살이 찢어지며 꺾어지는 ‘쩌르렁’ 소리는 골을 타고 공명하며 더욱 웅장해지고는 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어디까지나 나의 예측 능력 안에 있는 것이었다.
아직 저학년이지만 이미 한 학기 동안 패가 갈릴 대로 갈린 3학년 교실로 전학한 나는 날마다 고역이었다. 아침저녁으로 가방을 예닐곱 개씩 메고 다녀야 했다. 겉으로는 가위바위보라는 평등한 규칙을 따랐지만 언제나 지는 것은 나였다. 티격태격 이리 불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는 것도 다반사였다. 외할아버지는 상놈의 말이라며 울산 말을 배우지 말라고 하였으나, 너무 확연히 구별되는 말씨로 인해 날마다 고통을 겪는 나로서는 하루 빨리 배우지 않을 수 없었다. 파도 다음으로 나를 일상적 공포로 몰아넣는 것은 단연 말이었다.
파도는 어머니가 가끔 시키는 심부름으로 인해 불과 몇 달 만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아침 국거리로 미역을 따기도 했고, 졸여서 밑반찬으로 만들 수도 있는 홍합이며 굴을 따는 날도 많았다. 대낚시로 생선을 잡기도 했고, 헤엄을 치고 잠수를 하고 나룻배를 젓기도 하며 점차 짠물 냄새 풍기는 갯가 소년이 되어 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말씨도 바뀌어 더는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고통 받는 일은 사라졌다. 또 학년이 올라가면서 친구들과도 서열이 확립돼 더는 불편할 일이 없었다.
6학년 초, ‘그놈들’ 가운데 하나의 목을 움켜잡고 비틀어 땅에 내던진 다음 그 배 위에 올라타 머리통을 돌부리에 찍어 대어 마침내 피를 보게 한 장면은 내 소년기 절정의 영상으로 남아 있다. 물론 그 친구는 학창 시절 나의 단짝이 되었으나, 잘 나가는 건달의 길을 걷다 그만 불의의 사고로 건강을 잃고 말았다. 그와는 꽤 오랫동안 드문드문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대학 진학 무렵부터 어느 순간 가늘디가는 그 끈마저 끊어지고 말았다.
파도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말씨의 고통에서도 자유를 찾은 터에 두터운 인맥까지 형성되고 있었으니, 이미 울산은 진정한 나의 터전이 아닐 수 없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학력고사를 앞두고 제일 가까운 친구와 서로 약속을 한 적이 있다. ‘이다음에 대학을 졸업하면 꼭 울산에 돌아와 울산을 위해 무엇이든 힘을 모아 일해 보자’는 거였다. 그러나 내 기억이 맞는다면 그는 아직 울산에 돌아오지 못했고, 나 또한 겨우 10여 년 살았을 뿐이다. 지금 나는 서울에 살며 곧 인근 신도시로 이사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최북단의 봉화군 석포면은 강원도 태백시와 접해 있는 산중 마을이다. 그런 석포에서도 서낭골은 화전민 촌에 버금가는 오지였다. 1978년, 석포를 떠나 울산으로 향한 것은 순전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이었다. 중화학공업으로 흥기하던 울산의 일거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전형적인 취업 디아스포라(Diaspora)였다. 아버지는 노동을 찾아 이주하였고 나는 이주민을 찾아 이주하였지만, 정주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결국 나는 영원한 이주민인 셈이다.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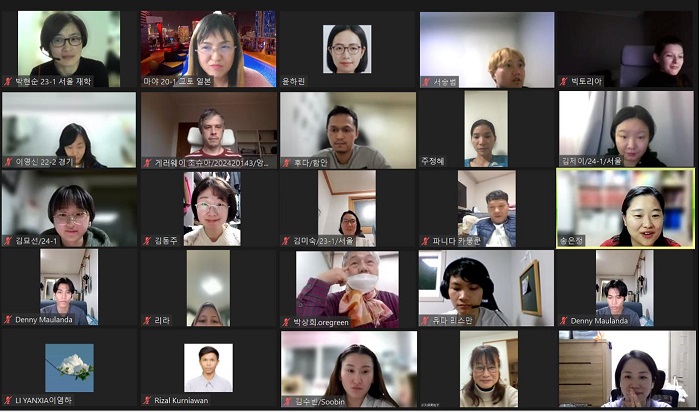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