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30년 전이다. 이제는 소설가로 유능하기도 하고 유명하기도 한 그가 1년 후배로 입학했다. 신입생 티를 얼마간 벗은 2학기 초쯤인가 그와 나는 학과 세미나 실에서 시와 소설과 문학에 대하여 꽤 주제넘은 대화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들 끝에 그에게는 또래집단의 보편 감각과는 다른 장기가 있음을 알았다. 가령 굿이나 무당을 미신적 습속으로 치부해 경원한다거나, 점이나 꿈 해몽 따위를 비과학적 일탈이라고 비판하는 추세와는 분명 다른 것이었다.
그는 손금보기의 달인이라고 했다. 손금에는 길흉화복의 미래가 모두 들어 있다고. 또 손금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도 알 수 있고, 결정적으로는 수명까지 짐작해 볼 수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두 손바닥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새겨서 들고 다니는 존재들이었다. 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모두 내 손에 들어 있는 거였다.
처음에는 별로 믿기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다. 20대 초반의 열혈 청년이 믿고 의지하기에는 사실 너무 놀라운 불합리 아닌가. 그러나 재미삼아 장난삼아 후배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러쿵저러쿵 그의 장황한 해석을 들으며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나의 미래를 모두 느꼈다. 이제 세월이 흘러 그의 해석은 다 잊어버렸지만 한 가지는 남아 있다. “형은 그냥 집 한 채 겨우 갖고 살 거예요."
살아야 할 미래가 진짜 ‘구만리’인 청년이었지만 왠지 나의 미래는 밝기보단 어둡고 넉넉하기보단 가난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가볍게 시작한 장난이 ‘뜨거운 피’를 식히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와 나는 졸업을 했고, 소설과 시로 갈라져 이래저래 자주 보지 못하고 산다. 드물게 문단의 행사장에서라도 만나면 처음엔 반갑게 인사를 하지만, 곧 주고받을 화제가 떨어지고 만다.
그런 그를 언젠가 만나 하나 남은 그 우울한 기억을 애기한 적이 있다. 예상대로 그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런 터무니없는 ‘나의 기억’에 놀라는 눈치였다. 별걸 다 기억하신다며, 진짜 장난이었다며. 자신은 손금 해석의 달인은커녕 그런 행위는 고등한 지적 생명체에게는 전적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관점을 가졌었다고 했다. 원래 고통의 기억은 때린 사람이 아니라 맞은 사람이 기억한다고 했던가.
그런데 집이 한 채라면, 그게 정상 아닌가? 한 채면 되지 더 있어 뭐 하려고? 애국심 투철해 세금 더 내려고? 아니면 집 없는 이웃에게 무상으로 사용권을 주려고? 지극히 당연한 생각을 30년 전에는 왜 하지 못했을까. 왜 집 한 채를 가난의 이미지로 연결했을까. 혹시 후배의 말 가운데 ‘명사’(집 한 채)가 아니라 ‘부사’(겨우) 때문이었을까. 알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집 한 채’면 충분하다.
이곳 횡성군 강림면 일대에도 잘 지은 신축 주택들이 많다. 펜션이랍시고 화려하게 지은 영업용 말고도 곳곳에 들어선 주택들은 색깔과 디자인 면에서 개성들이 넘친다. 이른바 ‘응답하라 1988’ 식의 ‘슬라브’(slab) 주택 하면 떠오르는 천편일률과는 분명히 다르다. “저런 집 한 채면 역시 충분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런데 그런 잘 지은 집들 사이사이 혹은 아직 작물이 자라지 않는 진짜 황토밭 사이사이에는 빈집도 많다. 사람은 떠나고 집만 남은, 곳곳에 남은 황폐한 빈집들. 내력을 정확히 알 수야 없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버려둬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넉넉한 집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시 새집을 지어 살든가, 철거해서 농토로라도 썼어야 한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들을 보노라면 왠지 야반도주의 영상이 떠오른다. 꼭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살던 집을 그대로 두고 떠나는 어느 불운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직 어린 아이들이 떠오른다.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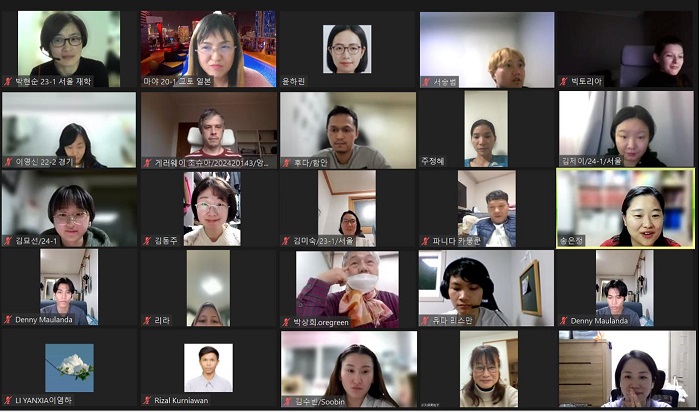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