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버덩’(古坪의 우리말)의 아침은 먼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아직 어둑어둑한 새벽에 어쩌다 눈이 뜨여 엉거주춤 책상 앞에 앉았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열리는 하늘과 굴뚝과 연기.
창을 통해 펼쳐지는 연기의 불규칙한 운동은 이 마을이 내게 어떤 심층적 원형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에너지의 양과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저 하얀 상승. 임계점을 넘긴 허공의 높이에서 활짝 열리는 유려한 곡선. ‘신을 기다리는’ 예버덩의 첫 아침은 내게 그런 부드러운 원형의 풍경을 선사했다.
어찌하랴. 서울을 떠난 새들은 모두 이곳에 와 있었다. 고향을 떠난 새들이 서울에 살다 서울을 떠나 고향에 온 듯 예버덩의 새들은 아침 풍경의 정수리에서 맑은 음색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 많던 새들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새들은 패망한 왕조가 아니라 강역(疆域)을 넘나드는 진정한 자유를 구가하고 있었다.
새들의 섭생과 생식과 자기 방어와 같은 생물학적 관심은 애초부터 접어두기로 한다. 새들과 무관하게 새들은 자유롭고, 새들과 상관없이 새들은 ‘바가본드’(Vagabond)이며, 새들과 무연하게 새들은 강원도 횡성의 한 마을을 소리로써 상징했기 때문이다.
또 이곳 개들은 낯선 이를 보면 무지막지하게 짖어댄다. 필사적으로 짖어대는 개들은 그러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낯선 이를 얼마간 좇아간다. 그러나 자기 보호를 넘어 상대를 겁박하는 살의가 아니다. 그러기엔 이곳 견공들이 휘젓는 꼬리의 율동이 너무 앙증맞다. 견심(犬心)을 알 수야 없지만 자주 볼 수 없는 한 낯선 사람을 대하는 개들의 ‘무서운 호기심’이라고 생각하기로 한다.
4월에도 눈이 온다는 횡성군 강림면 주천강은 아직 군데군데 얼어 있었다. 본류마저 곳곳이 얼어 있으니 여기 합수되는 개울들이야 말해 무엇 하리. 산골을 타고 내려오는 가는 물줄기들은 그 흐르던 모습대로 울퉁불퉁 얼어 있었다. 아직 사방이 황갈색으로 가득한 초봄, 아침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얼음 줄기의 반짝이는 색감은 아주 튼튼하게 잘 생긴 이 마을의 어금니와 같았다.
이 얼마나 상식적인 아침인가. 식은 방바닥은 데워야 하고, 물은 끓어야 국이 되고 밥도 되는 것을. 그런 연기는 하늘로 오르고 새들은 부감법으로 먹이를 찾는 것을. 나무는 땅에서 정기를 받아 위로 위로 자라는 것을.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높은 왼쪽에서 낮은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것을. 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아침인가.















.jpg)
.jpg)
.jpg)
.jpg)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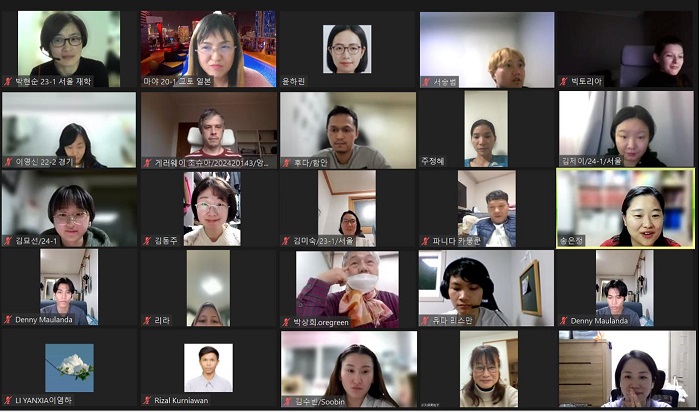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