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시 한 편만을 읽어볼 생각이다. 느닷없이 찾아온 게으름이 아니고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게으름을 들켜버린 것이라고, 독자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시인에게 현실은 그저 근원적 진리의 파생적 상황에 불과하고, 시인은 세계와 시인을 규정하는 근본적 구조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동시에 시인은 일상의 현실 속에서 이 세계 내부의 존재적 관계를 의심한다. 인간이 그저 내세계적 존재로서 세상에 내던져진 것 같은 본질적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 지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주체적 주관의 내적 상태에 의해 어떤 정황들이 만들어지지는 않다고 항변한다.
시인이 삶에서 발견하는 이러한 진리는, 시인의 인식작용과 시적 대상 사이의 일치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은폐 상태로부터 폭로하거나 적어도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되게 된다.
처음엔 작은 활자들이 기어 나오는 줄 알았다
신문지에 검은 쌀을 붓고 바구미를 눌러 죽이는 밤
턱이 갈라진 바구미들을
처음엔 서캐를 눌러 죽이듯 손톱으로 눌러 죽이다가
휴지로 감아 죽이다가
마침내 럭셔리하게 자루 달린 국자로 때려죽인다
죽임의 방식을 바꾸자 기세 좋던 놈들이 주춤주춤,
죽은 척 나자빠져 있다가 잽싸게 도망치는 놈도 있다
놈들에게도 뇌가 있다는 것이 도무지 우습다
혐오도 죄책감도 없이
눌러 죽이고 찍어 죽이고 비벼 죽이는 밤
그나저나 살해가 이리 지겨워도 되나
고만 죽이고 싶다 해도 기를 쓰고 나온다
이깟 것들이 먹으면 대체 얼마나 먹는다고
쌀 한 톨을 두고 대치하는 나의 전선이여
아침에는 학습지를 파는 전화와 싸우고
오후에는 종이박스를 두고 경비와 실랑이하고
밤에는 하찮은 벌레들과 싸움을 한다
난 죽이기 싫다고 해도
누가 등이 딱딱한 적들을 자꾸만 내게로 내보낸다
열기로 적의로 환해지는 밤,
누군가 와서 자꾸만 내 이불을 걷어간다는 생각,
자꾸만 내게서 양수 같은 어둠을 걷어간다는 생각,
날이 새도록 터뜨려 죽이는 이 어둠은 가히 옳은가
- 문성해,「바구미를 죽이는 밤」 전문
시인에게 현실은 단순히 미래를 위한 역동적인 자기투여의 공간이 아니다. 시가 단순히 삶의 인위성과 공작성(工作性)에서 비롯된 파편화되고 유희적인 환영에 의해 현실을 점검하고자 하는 알리바이도 아니다.
위 시에서 시인은 자기의 언어 공간에 갇혀 있는 상황을 일원적 논리가 아닌 다층적 구조로 구현하면서도 표면적 서사는 선명하게 드러낸다. 평범한 일상의 어느 저녁, 화자는 “신문지에 검은 쌀을 붓고 바구미를 눌러 죽이는" 행위에서 시작해 “누군가 와서 자꾸만 내 이불을 걷어간다는" 공포와 “자꾸만 내게서 양수 같은 어둠을 걷어간다는" 공포로 치닫게 된다.
“혐오도 죄책감도 없이" 바구미를 “눌러 죽이고 찍어 죽이고 비벼 죽이는"는 모습은 “아침에는 학습지를 파는 전화와 싸우고/오후에는 종이박스를 두고 경비와 실랑이하"는 모습과 겹치게 된다. 세계 안에서 혹은 현실의 벼랑 앞에서 직면하게 되는 존재의 비극성을 여실히 지적하면서도 시인은 이 갈등을 면밀하게 언표 안에 감추어놓는다. 자위적 매개 없이 일상의 풍경을 중심으로 시인의 본질적 의무를 외롭게 수행하는 시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시인의 언어는 윤리가 아니라 의미를 생성하고 차이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 너머의 언어이다. 작품 속 화자는 일상의 삶을 인위적으로 질서화하고 논리로 설명하고자 하지 않는다. 화자는 도전받는 ‘어둠’을 통해 일상에 침입하는 거대한 폭력적 메커니즘을 의심한다. 화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화자가 “죽이기 싫다고 해도" “자꾸만 내게로 내보’내지는 딱딱한 적들. 화자는 이 적들로 인해, 양수처럼 평온해야 할 밤을 "열기와 적의“로 훼손당하고 있다.
시인은 하나의 언어에 내재된 의미나 형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어떤 틈 내지는 균열을 재현하기 위해 자신만의 시문법을 만들어낸다. 혼돈의 미로 같은 삶의 풍경을 계산된 인공적 호기심이 아니라, 주체 내면의 자연적 의식으로 의심하고 정신적 탐색을 투영하려는 시인의 자세는 우리 시의 정통주의자의 면모와 닮아있다.
지금껏 의심하지 않았던 현실의 실제에서 진짜와 가짜, 주체와 대상, 현실과 환상 간의 경계를 물으면서 그 간극을 인식한다. 시인에게 현실은 쉽게 들어갈 수는 있으나 쉽게 나올 수는 없는 미로와 같은 공간으로,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불확정적 가치와 기원을 알 수 없는 폭력적 메커니즘의 세계이다.
시인은 작품을 통해 일상의 폭력, 주체의 의지가 상실된 강제된 폭력이 현실의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궁리한다. 일상적이고 통속적으로 이해되는 삶의 한 단면이 삶의 “전선"이 되는 순간이다.
시인은 “신문지에 검은 쌀을 붓고" 눌러 죽이는 ‘바구미’를 통해 그동안 망각에 의해 은폐되었던 거대한 메커니즘, 존재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궁리에 대한 답을 쉽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시인은 그것은 각자의 몫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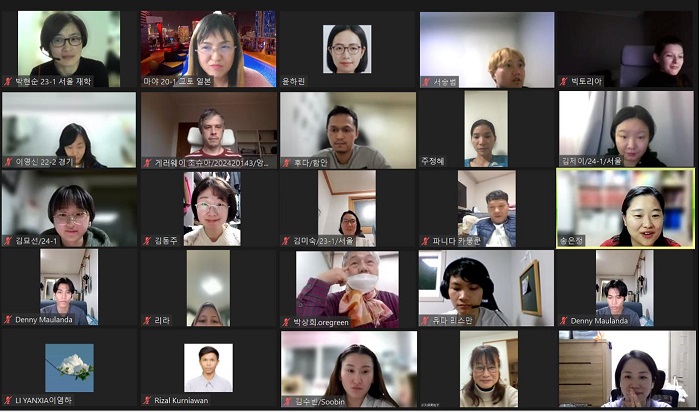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