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한 자료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입정원 48만3000명 기준 대비 2021학년도에는 5만6000명의 미충원이 예상되고 이를 감축하기 위해 38개교의 폐교가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이미 문을 닫은 대학교의 전직(前職) 교수들이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력의 활용을 위해 정부에 지원도 요청했다. ‘폐교대학 교수’은 사회적협동조합 대학교수발전연구원을 조직했다. 지난 1월에는 11명의 발기인이 대전에 모여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조만간 교육부에 설립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연구원 설립의 목적은 폐교대학 교수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정책 기초자료 수집·조사, 연수·강의 지원 등이 핵심 사업이다. 이덕재 대학교수발전연구원 이사장은 "폐교대학 교원들은 버림받은 소외계층"이라며 "스스로 자력갱생의 길을 찾고 교육정책을 바로 잡아나가자는 취지"라고 연구원 설립취지를 밝혔다.
폐교대학 교수들은 대부분 임금이 체불된 상태다. 대학이 폐교되면 잔여재산을 청산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지만 대학의 토지와 건물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어 청산이 쉽지 않다.
지난해 3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실시한 폐쇄(폐지)대학 및 해산법인의 체계적 사후조치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8년 1월 기준 16개 폐교 대학 중 1개 대학만 청산이 완료됐다. 연구원은 대학 폐교로 실직한 교수 900여명, 이들의 체불임금액으로 800억원을 추산하고 있다.
대학이 폐교되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은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이 가능하지만 교직원들은 관련 규정이 없어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교직원들은 사학연금 가입자여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대학이 폐교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사학연금도 2016년 법이 개정되기 전엔 20년 동안 납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폐교대학의 교수들은 연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태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수 수요가 감소하고 폐교된 대학의 구성원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이들이 타 대학의 교단에 서기란 쉽지 않다.
그는 "며칠 전엔 대학이 폐교된 이후 이혼을 당했던 성화대 보건계열 한 교수님이 혼자 살다가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른 채 발견됐다"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명의 50~60대 교수님들이 돌아가셨다. 인과관계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스트레스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끼린 다음엔 누구 차례일까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을 정도"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폐교대학 구성원을 위한 지원을 시도 중이다. 지난해에는 관련 예산 1000억원을 편성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 설립에 약 200억원, 체불임금 대지급 약 800억원 등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이사장은 "폐교대학 교수들은 다 박사학위 소유자인데 이들을 사장(死藏)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력 소실"이라며 "국가가 민법상 청산인들에게만 대학 폐교절차를 맡겨놓고 모른 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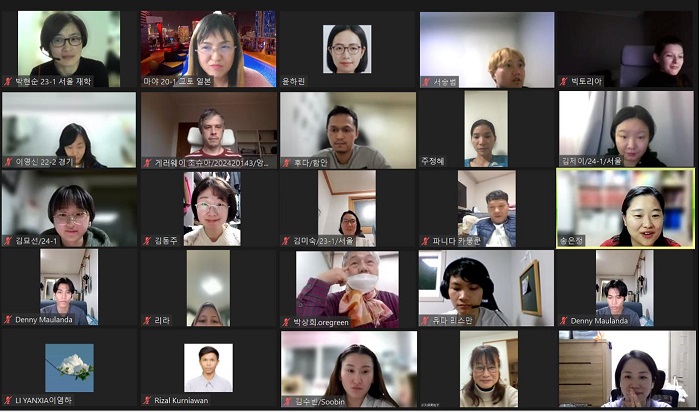

.jpg)






















